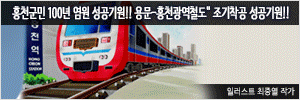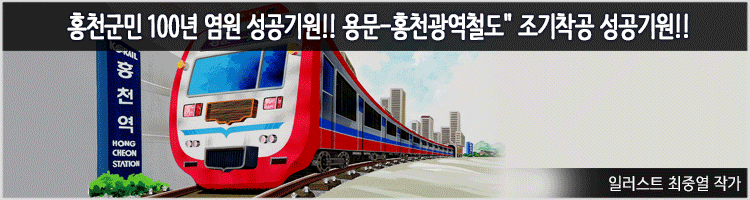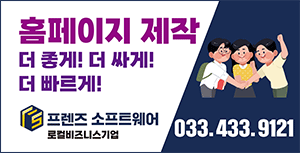|
기류에 몸을 맡긴 채 창공에 떠있던 독수리 한마리가 지상을 향해 쏜살같이 내리꽂더니 들쥐 한 마리를 낚아채 능선 너머로 사라졌다. 불어 튼 발가락에서 전해오는 전율이 속도를 더디게 했다. 태양이 서녘 산기슭에 걸쳐 하루를 마무리 하려 하지만 나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일은 없다. 오늘만 있을 뿐이다. 5년 전 호주 아웃백 530km 레이스 때 맞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랬다. 그래, 나는 기여서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저녁 6시를 넘겨 길게 드리운 저녁노을을 향해 달리다 레이스의 끝자락을 봤다.
남으로 남으로, 레이스 넷째 날 Gjirokaster를 넘어 39km를 달려서야 알바니아 남부 끝자락 Mesopotam 지역에 다다랐다. 주로는 온통 돌무더기로 넘쳐났다. 이방인의 진입을 저지하려는 양떼들이 곳곳에 무리지어 길목을 막고 풀을 뜯었다. 선수들은 능선을 따라 앞 다퉈 산 정상을 향해 기어올랐다. 온 신경을 곤두세워도 눈의 힘이 빠지면 주변이 뿌옇게 보였다. 숨이 턱까지 차고 절로 고개가 처박혔다.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이 있다. 단지 남이 눈치 채지 못할 뿐이다. 내가 숨을 고르면, 그도 숨을 고를 것이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면, 그도 죽을 만큼 힘들 것이다.
거리에는 유독 마더 테레사의 사진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알고 보니 인도와 외국에서 고아와 빈자들을 위해 평생 헌신한 그녀의 고향이 알바니아라고 한다. 그녀를 추앙하는 알바니아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티라나 공항 이름이 「마더 테레사 국제공항」인 이유도 이제 알았다. 오지에는 이정표도 산 이름도 없다. 오지는 망망대해다. 선수를 위한 임시 비표만 있을 뿐이다. 자칫 이 표시물을 놓치면 표류하기 일쑤다. 오후 3시 40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서 깊은 수도원(Ancient Monastery of Mesopotam) 마당에 둥지를 튼 캠프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방전될 뻔한 몸의 에너지를 재충전했다.
레이스 다섯째 날 새벽, 묵직한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렸다. 좀비처럼 일어나 무덤덤하게 아침을 먹고 장비를 챙겨 들러 맸다. 지난 나흘 동안 부상과 피로가 누적된 모양이다. 하지만 ‘곧 웃음을 되찾으리라~’ 아침 6시, 일단의 무리가 여명을 가르며 평원을 향해 뛰쳐 나아갔다. 문명과 단절된 오지에는 없는 것이 많다. 협박, 배신, 폭력, 이간질, 소음, 매연, 뒷담화 그리고 분노까지. 이곳에는 오직 정직한 자연만 있다. 나는 자연력의 지배를 받는 알바니아 산야에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갔다.
양떼 무리 근처를 지날 때는 어김없이 개들이 달려들었다. 녀석들은 본능에 충실했다. 녀석들에게 물리면 나만 손해다. 그러니 요령껏 피하는 수밖에… 가시 돋친 잡목에 긁혀 종아리가 성할 틈이 없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남과 겨루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다. ‘흐느적거리지 말자!’ 아무도 눈길 주지 않지만 흐트러진 내 모습이 싫다. ‘아파도 아파하지 말자!’강해지려면 오랜 담금질이 필요하다. 산 정상에 가까워 오자 아드리아 해의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저녁 6시 53분, 마지막 선수가 Murci 마을 캠프에 입성했다. 내가 밟은 길을 따라 그가 왔다. 내가 멈췄던 곳에서 그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쉬어왔을 것이다. 마지막 장비 점검을 하는 선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내일 결승선의 멋진 세리머니를 상상하는 모양이다. 알바니아 레이스의 빅 이벤트! 저녁 7시, 캠프 근처 마을 광장에서 선수들을 위한 만찬이 열렸다. 식사는 물론 공연까지 곁들여진 특별 무대였다. 마을사람들까지 순식간에 광장을 가득 메웠다. 마을도 덩달아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무희들의 열정적인 춤과 노래에 선수와 주민들이 어우러져 광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레이스 마지막 날, 지난 6일 동안 베라트에서 시작된 220km 대장정의 대미를 맞았다. 아침 6시 30분, 선수들이 결승선이 있는 부트린트의 고대 유적지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오지에 서면 내 안은 늘 충돌과 어긋남의 연속이다. 길들여진 나와 길들여지지 않은 나. 이성적인 나와 무데뽀인 나. 주저앉으려는 나와 일어서려는 나. 내 안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번뜩 눈이 띄었다. 나의 본 모습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레이스 거리 14.7km. 어쨌든 달리고 또 달렸다. 쉬지 않고 달렸다. 배낭이 가뿐하니 덩달아 몸과 마음까지 가벼웠다. 부트린트 유적지로 들어서려면 이오니아 해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운하를 건너야 했다. 마지막 관문이었다. 운하를 왕래하는 바지선에 빨리 올라타야 먼저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다. 레이스 중에 협곡이나 호수는 건너봤지만 운하를 건너기는 난생 처음이다. 멀리 보이는 선착장을 향해 숨넘어가게 뛰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바지선을 놓치고 말았다. 뒤쫓던 선수들도 숨을 헐떡이며 줄지어 도착했다.
원본 기사 보기:모르니까타임즈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